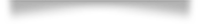<적은 생활, 작은 철학, 낮은 공부(이하, "적은, 작은, 낮은"으로 약칭)>은 ‘나는, 너는, 우리는 진짜인가?’라는 서늘한 질문의 터에 사람들이 들어가 기꺼이 기거할만한 한 채의 집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시공기라 할 수 있다.
‘너는 가짜(일지 모른)다’라는 최후의 심판을 저 멀리 하바드나 동경대 혹은 저 높은 옥황상제나 하느님 앞에서 받으려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내 이웃과 동무들이 나의 실력과 가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최종 심급의 지위를 얻게 되는 ‘알짬있는’ 사회가 되지 못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나 자신의 존재론적 구성여부에 대한 참회를 기반으로, 이녁들의 생활 속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부를 위해서 ‘나는, 너는, 우리는 진짜인가?라는 아픈 질문으로 대변되는 존재론적 비평의 시선 앞에 나를 내어놓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최종심급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생활의 터에서 ‘진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몸과 영혼, 의식과 무의식을 총동원(응하기, 어학, 규칙, 몸, 버릇, 낮은 중심, 돕기, 호흡(守意), 자득, 산책, 암기, 개념, 매개, 노동, 行知, 모방 등)하여,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일급/일류의 공부인이 되라는 것이 k선생의 가르침이자 그 후학과 이녁의 공부길을 향한 지침이다.
달리 말해서, 공부라는 것은 매사에 진짜를 구하는 애씀이다. 그리고 그 쉼 없는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진 솜씨를 가리킨다. 돌이켜 자신을 성찰하는 일조차 필경은 스스로가 ‘진짜’인지를 되묻는 노릇을 말한다. 가령 한국 사회를 막돼먹은 곳이라고 통새미로 타박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안타깝고 성가신 것은 주변에서 만나는 지식인이나 일꾼을 가릴 것 없이 제 일에 대한 관심과 솜씨로써 속알이 꽉 찬 경우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결국 진짜가 되는 길은 일(事)과 물건(物)을 대하는 법식(物至而應事來而辨)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내 부족한 깜냥과 솜씨를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 수 있을까, ‘갖은 곡절을 다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른바 ‘존재론적 비평’의 주체가 되고자 애써오고 있는 것이다. 군자(君子)니 초인(Übermensch)이니 달인이니 혹은 그 무엇이니 하지만, 요점을 진짜가 되려는 애씀에 있을 뿐이다. 154,5
‘나는, 너는, 우리는 진짜인가?’라는 질문의 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사의식 안에서는 늘 금기시된 금단의 영역이었으며, 이 터를 그득히 메우고 있는 ‘졸부’ ‘속물’ ‘사이비’에 대한 비평은 그러므로, 특정 집단 혹은 특점 개인만을 향한 비평일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주의적-체계적’ 증상에 대한 비평/비판마저도, 압축성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시공간 속에서는 ‘낙관주의적-개인적’ 지목(pointing/naming)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교환가치’가 얻어지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합리성은 제대로 된 평가와 배치에 의존한다. 세상과 사태의 시비곡직을 분별할 줄 아는 중론(衆論)이 꾸준히 삶을 향도할 수 있어야 공정(公正)의 문화가 퍼지고 원망은 줄어든다. 권력의 후광이나 자본의 욕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론과 비평적 실천이 지속되어야 ‘진짜’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가짜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된다. 그러나 내가 살아본 이 사회는 엄살과 원망이 들끓는 곳이다. 변덕과 ‘작은 차이의 나르시시즘’이 횡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과시와 허영이 유행처럼 번득이는 곳이다. 그래서 졸부와 속물의 세상이다. 그러나 (조르주 소렐의 분류처럼) 이러한 비평은 ‘낙관주의적-개인적’ 지목일 수는 없다. 내가 굳이 김(용옥) 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의 학력/학력(學歷/學力)이 남다르고 그 지명도나 영향력이 다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이루어진 그의 지식활동과 그 행태가 ‘비판주의적-체계적’ 증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233
“엄살과 원망이 들끊는 곳”, “변덕과 ‘작은 차이의 나르시시즘’이 횡행하는 곳”, “과시와 허영이 유행처럼 번득이는 곳”, 그리하여 “졸부와 속물의 세상”이 되고야 만 이 땅은, 위 인용구에서 나타나듯, 김용옥이라는 돌올한 개인에 대한 날선 시선을 통해 잡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졸부와 속물의 세상이 김용옥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나 스스로는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을 뿐더러) 남한 사회의 졸부와 속물의 어떠함을 집어 내기 위해서는 작금의 현실을 빚어낸 인류사회학적, 정치역사적, 경제사회적 근간을 더 촘촘히 훑어야 보람이 있을 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김 모씨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TK에 대한 k선생의 관점에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TK에 대해서 퍼져있는 가장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그들이 세상을 보고 품평하는 그 시야의 궤선과 잣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의 근현대사가 처했던 지정학적 굴곡과 피해를 상상해보면 의당 납득할 수 있는 의식의 물매다.) 이로써 ‘몰락하고 있는 이 엘리트 계층’이 진정으로 욕망하고 있는 속내를 놓치게 된다. 톨스토이처럼, ‘교양교육의 향수’ 속에 깃든 그들의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TK가 주체가 되어 호명하는 대상들이 어떤 정신문화적 기울기 속으로 내몰리며 축출당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요컨대 이 대상들 –빨갱이, 전라도, 그리고 예수쟁이 – 은 이데올로기적 배치나 그 평가 속에서 타매되기 이전에, ‘가장 좋았을 때의 귀족(양반)사회에 대한 여전히 남아 있는 동경’의 눈매로써 폄훼, 왜곡당하고 있는 것이다. 299
몰락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으로써의 TK에게 있어, 빨갱이, 전라도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한마디로 되먹지 못하고 배워먹지 못한 “비루한 쌍놈”(301)인 것이며, 이 쌍놈들은 이 사회의 전통과 풍습을 근본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k선생은, TK라는 의고주의의 실체에 대해 “한반도의 고전 교양의 유택(遺澤)을 담지한 주체로서 긴 세월의 자부심이 체득한 곳이다. 이들의 정신적 뿌리였던 유교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압축-청산-편파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수모를 겪고 훼상당하였지만 소멸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처럼 속히 소멸될만한 잔뿌리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조선만을 꼽아도 반 천년의 세월에 걸쳐 불교 등의 종교문화나 여타의 습속을 성공적으로 억압하면서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체화하는 인문주의적 교양으로서, 녹록치 않은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교양의 문화는 비록 그 사회적 실효(Geltung)가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실존적 의미(Bedeutung)만은 녹슬지 않은 것이”(302,3)라며 은근한 눈길을 주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 한국사회에서 여태 ‘전통’이라고 할만한 정신의 집약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곳이 유학의 흔적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너는, 우리는 진짜인가?’라는 무시무시한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TK에 새겨진 유학의 흔적에 스스로의 소종래(所從來)를 잇대어 볼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뿐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경북 성주 출신의 ‘마지막 유학자’ 심산(心山) 김창숙 선생(1879년 8월 27일~1962년 5월 10일)께서 운명하시기 오일 전인 1962년 5월 5일,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선생을 병문안 왔으나, 이미 의식이 없는 심산 선생은 마치 박 의장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사진만을 남기셨고(더불어, 박 의장 꼴보기가 싫어 병문안 온 그이를 끝내 외면하셨다는 소문을 함께 남기셨다), 심산 선생 타계 하루 뒤에 박 의장은 선생의 빈소를 방문하여 극진한 예로 선생을 추모하였다. 심산으로 상징되는 ‘깨어있는 유림’은, ‘소명을 지닌 지도자의 일종’(289)이었던 남다른(?) 독재자도 무시 못할 권위와 카리스마를 담지하였던, 한반도의 마지막 ‘실력’이었는지도 모른다(또 다른 여담이지만, 외국인에게 '한국'의 자랑할만한 역사를 소개해보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그리고, 갑자기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삼성/엘지/현대차와 함께 BTS를 소개해야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약 혹은 설명하기 힘든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한반도 역사의 missing link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한말 말가!).
https://namu.wiki/w/%EA%B9%80%EC%B0%BD%EC%88%99
가짜와 사이비가 판치는 한국 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TK적 의고주의 향수에 되먹히지 않은 채, 더 나아가,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자신의 솜씨와 권위로써 증명하는 데 완벽히 무능하고, 자신이 사적으로 소속된 기득(旣得)의 세력에 의지하려는 태도”(272)로써의 속물주의와 결별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진짜됨을 입증하려는 이들(특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린/젊은 이’들, 소위 한문과는 담을 쌓고 사는 MZ세대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스러져버린 TK가 아닌 무엇을, 누구를, 어디를 행해 그들의 공부의 지향을 뻗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내 궁금해 진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k선생은, 강항의 <간양록>의 인용(“왜놈 풍습에 어떤 재주, 물건이라도 꼭 천하제일을 내세웁니다. 이는 명수(名手)에게 나온 것이며 천금을 아끼지 않습니다.”(154))을 시작으로, 스스로 멀고 먼 길을 돌아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을 기어이 호명/호출하기에 이른다.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이 ‘달리’ 보기에 된 일은 곧 나 자신이 달라진 것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나 자신이 개입한 그 현상을 ‘거짓말’로 자각한 것이니, 이는 곧 나로서는 작은 해방의 체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어쩌면 피해자는 그 가해자로부터 두 번 해방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일본과의 역사에서 상처받은 우리는 그 상처의 기억 속에 앎의 맹점을 온존시키면서 부지불식간에 이를 일종의 자기방호의 이데올로기로 오용하고 있다. 현실을 부여잡고 있는 이 맹점이 굳어지도록 방치하면 이 맹점은 어느새 실재가 되고 말 것이다. 285
대상에 대한 이해는 대상과의 적절한 원근감이 필시 중요한 지침이지만, 분석의 정세도 또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분석/이해의 틀이 90년대 이후부터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시스템을을 Ctrl+C, Ctrl+V하여 구성된 것이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이니, Delete를 아무리 열심히 눌러재껴 그 모방의 흔적을 틈틈이 지운다 한들, 이미 해방 이후의 ‘한국인됨’에 구성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일본의 영향을 없는 체하려는 노력 그 자체는, 마치, 조선총독부 건물(옛 국립중앙박물관)의 첨탑이 해체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하였던 1995년 8월 15일 그날처럼, 일종의 스펙터클로써의 효용가치 정도를 얻을 수 있을 뿐, 스펙터클의 심부에 복류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뿌리 깊은 원한과 피해의식, 질투와 선망 등에 나타나는 변화의 낌세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지경이다.
이러한 복지부동의 거시적인 역사이해와는 별무상관으로, 가성비를 지극히 중히 여기는 새대의 새로운 눈과 귀가, 과거와는 달리 일본을 향한 미시적 이해와 지평을 차분히 쌓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여러 정황이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대에게는, 그것이 일본이든,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콩고든, ‘좋으면 그만’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높이 사는 경향이 있고, 이들에게 있어 일본은 가까워서 여행가기 좋은 나라, 만듦새가 좋은 나라, 어딜 가든 깨끗한 나라, 무서울 정도로 친절한 나라, 엔저현상으로 쇼핑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그러나, 영어를 지독히 못하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거시적 차원의 역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일본의 장점을 에둘러 분석할 것도, 해석할 것도 없는 셈이다(이러한 태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No Japan 운동의 첨단에서 MZ세대가 자리하고 있음 또한 분명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생활인들의 터전, 즉, 미시세계에서는, ‘진짜’가 무엇인지 쉬이 분별이 되며, 이 분별은 약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기 마련이다. 갓난아기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일제’ 육아용품은, 애국심에의 호소도 별무소용일 뿐. ‘대체 불가의 필수용품’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진짜’로써의 일제 육아용품에 대한 평가는, 초보엄마들이 모여있는 몇몇 카페만 살펴봐도 이미 환한 사실이다. 젊은 소장학자들 가운데서는, 일본의 최신 연구경향이 소개된 각종 학술잡지를 열심히 번역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소개하고 자신의 공부에 활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풀뿌리 시민단쳬는 어떠한가. 한국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일본의 시민단체의 여러 활동을 귀감으로 삼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 마디로, 미시세계 속 생활인들에게 있어, 일본은 이미 비상한 솜씨를 지닌 좋은 이웃으로 터를 잡은 지 오래된 일. k선생이 경탄해 마지 않는 그 ‘일본’은 아마도 익히 알려진 미시세계의 ‘진짜’로써의 일본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을 터. 과연 k선생이 ‘모방’하고자 애쓰는 그 일본은 대체 무엇일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관통하는 일본의 남다른 문화 혹은 국민성의 하나에는 분명 그들이 ‘개미’와 같이 운신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규율을 잘 따르고, 집단 내부의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남다른 태도는 인간의 공동체에서 보이는 여러 미덕보다는 오히려, 군거성 동물 혹은 곤충집단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과 더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전일화된 작금의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나 ‘없는 중심(오타쿠의 모에(燃)문화, 등돌린 고객, 정치적 실권이 없는 천황 등)’을 향해 보이는 열성과 충의 등은 그저 초현실이거나, 고대/중세의 풍경을 보는 듯한 기묘한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더 나아가, k선생이 주장하는 ‘현명한 지배와 복종’의 가능성이 개화한 곳이 바로 일본은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해 보기에도 충분한, 여러 문화적/문학적 상상력의 토양을 공급해 준다.
사랑이나 자유처럼 그 내용물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부재의 탓에 오직 쉼 없는 상호 노동을 통해서만 근근이 제 모습을 얻는 것이다. 이를 일러 ‘동사적 실존’이라고 부를 만한데, 의식에 대한 제임스(W. Jasmes)의 설명처럼 이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정이나 자유와 같은 것을 대하는 인간의 실존적 개입이란, 곧 그것이 기능하도록 애쓰는 노동의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의 주체를 ‘현명한 독재자’라고 부를 만하다. 이것을 일러 독재(獨裁)라고 하는 이유는, 자유나 사랑의 알짬은 민주나 평등과 같은 이념에 의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치기 자유주의자들이 섣부르게 매도하는 게 전통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이 무너질 경우 더불어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아예 깜깜하다. 전통이 무너지면서 얻는 소득의 전망은 늘 환몽적인 데가 있고, 그 전망은 생활에 밀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조건을 왕왕 생략한다. 헤겔의 지적처럼, 자칫하면 자유의 열매는 폭력적으로 바스러지고 만다. 사랑과 자유는 실로 무내용(無內容)한 것이어서, 안이하게 대처하면 그것들은 손가락 사이에 흘러든 물처럼 곧 소실된다. 여기서 다시 ‘독재’, 그것도 ‘현명한 독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다. 자유나 사랑의 꿀맛은 독재의 쓴맛과 필경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20
‘현명한 독재’가 가능키 위해서는 ‘진짜(라고 명확히 인정받고 의심 없이 숭앙되는)’로서의 ‘현명한 독재자’의 존재가 등장해야 마땅하며, 그렇다면, 필시, 현명한 독재자에 의한 지배와 또 그에 대한 복종을 가능케 하는 그곳에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야 할 테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천하제일’의 솜씨를 위해서는 천금을 아끼지 않는다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 그리고, 다시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은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k선생의 평가처럼, “자유나 사랑의 알짬은 민주나 평등과 같은 이념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민주와 평등만을 부르짖는 곳에서는 수승한 실력으로서의 ‘진짜’가 진짜로서의 그 남다름을 세상에 선보일 만큼의 기회도 자극도 주어질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리고/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전문가주의와 아마추어리즘은 그 각각이 속해 있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분석틀 안에서 요란한 방식으로 서로 충돌하게 된다.
프로보다 더 프로 같은 아마추어가 많은 곳이 일본이고, 이 덕에 프로와 아마추어가 서로의 실력에 길항작용을 일으키는 곳이 일본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시세계 혹은 생활인의 소박한 영역으로 국한 될 뿐이다. 연구소 주임출신으로 200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가 도호쿠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가 그 학력의 전부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는 눈치이지만, 2019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요시노 아키라(吉野彰) 또한 사기업의 연구소에서 실무자로서의 이력을 쌓아왔다는 점만 보더라도, 일본의 기업문화가 학사 또는 석사 출신의 연구자들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정도의 해석만이 가능할 뿐(이는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무런 학위(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의 표지)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일본 과학사회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 더 높다고 가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생활의 지평 속에서야, 대기업 부장직을 마다하고, 100년된 노포를 3대째 이어가기 위해 라멘집으로 돌아온 동경대 출신의 효심 깊은 장남이 일본 곳곳에 실존하고야 있겠으나, 거시세계에서의 일본은, 그 어느 사회보다 더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남성) 전문가’의 세계이고, 이 (남성) 전문가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한 경쟁과 암투가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쟁과 암투에서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약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도, ‘개미-인간’들의 나라 일본이 여타의 (소위) 선진국보다 눈에 띄는 지점이다.
<“여자는 감점”…시대착오적 日의대 입시>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 2018년 어느 날의 기사를 보자(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19881).
도쿄의대의 입학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돼 있다. 1차는 학과목 필기시험, 2차는 논술과 면접. 직관적으로 2차 면접에서 점수를 덜 주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1차 필기시험 점수에서 여학생은 일률적으로 감점을 했다는 거다. 그것도 10%, 그 이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부정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0년 합격자 중 여학생 비율이 40%에 육박하자 여학생 합격을 억제하기 위해 감점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학 측이 밝힌 이유가 가관이다. "여자는 대학졸업 후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의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자는 ‘의사’라는 전문성을 갖추는데 있어 남자보다 많은 변수를 지니고 있어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2010년부터 7년 이상을 조직적으로 감점하는 방식으로 의대 입학을 저지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사회의 초고도화된 ‘전문성’이 은폐하고 있는 지점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일본의 전문성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약자들을 향한 수탈과 억압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장해 온 군국주의적 폭력성의 성취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폭력으로서의 전문성이 거시세계를 넘쳐, 미시세계 또는 생활터전으로 ‘걸려져’ 나온다 한들, 이미, 오염된 원전 방류수처럼, 그 본질에 있어 일본사회의 전문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미래(로서의 모방의 대상)일 수 없으며, 미래(로서의 대안)이어서도 안 된다.
일본 여행을 한번이라도 다녀온 적 있는 한국의 장삼이사라면 빤히 알고 있을 미시세계의 가능성과 귀함을 k선생이 접하고 또 해석함에 있어, 일본의 전문가집단이라는 거시세계의 스산한 기원을 모른 체 하며, 곱고도 단아한 미시세계의 풍경을 새로이 발견한 것마냥 높이 사는 데에는, 분명 명인과 달인이 자재한 이 별난 나라의 진면목을 구조적으로 기만시켜왔던, 그리하여 그 자신 ‘맹점’이 되어버린 한국인의 어두운 자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k선생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며, 그 “작은 해방의 체험”(285)이 k선생의 거시적-미시적 인식론적 지평에 자리하고 있던 자기방호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낸 ‘개안’의 경험을 다른 맹점의 ‘피해자들’에게도 공유하고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해 본다.
그러나, 일본의 미시세계의 완벽함에 대한 k선생 개안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소회로만 머물기에는, <적은, 작은, 낮은>이 의탁하고 있는 “실제적 임상성”(84)의 세계가 유독 일본사회에 대한 예찬에 과하다시피 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이 지점에서, 이토록 가짜와 사이비가 판치는 한국 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식민주의의 향수에 되먹히지 않은 채, 더 나아가,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자신의 솜씨와 권위로써 증명하는 데 완벽히 무능하고, 자신이 사적으로 소속된 기득(旣得)의 세력에 의지하려는 태도”(272)로써의 속물주의와 결별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진짜됨을 입증하려는 이들에게 있어, 폭력으로 구축된 전문가의 거시세계 속 일본(이라는 환상)이 아닌 무엇을, 누구를, 어디를 행해 그들의 공부의 지향을 뻗어가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에게 배울 바는 많지만, 그렇다고 공부의 현장실습지 또는 민족지적 현장(ethnographic field)을 일본으로 집중시키거나 한정시켜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한 역사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지리학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달라도 너무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견 닮은 꼴과 같아 보이는 영국와 일본의 지리적 차이점에 대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목소리는, 한국와 일본이 왜 그리도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전해 준다.
Superficially, these two archipelagoes appear to be geographic equivalents of each other off Eurasia’s east and west costs, respectively. (Just look at the map to convince yourself.) Japan and Britain look roughly similar in area, and both lie near the Eurasia continent so one would expect similar histories of involvement with the continent. In fact, since the time of Christ, Britain has been successfully invaded from the continent four times, Japan never. Conversely, Britain had had armies fighting on the continent in every century since the Norman Conquest of AD 1066, but until the late 19th century there were no Japanese armies on the continent except during two brief periods. Already during the Bronze Age over 3,000 years ago, there was vigorous trade between Britain and mainland Europe; British mines in Cornwall were the main source of tin for making European bronze. A century or two ago, Britain was the world’s leading trading nation, while Japanese overseas trade still remained small. Why do these huge differences apparently contradict straightforward geographic expectations? The explanation for that contradiction involves important details of geography. While Japan and Britain look at a glance similar in area and isolation, Japan is actually five times farther from the continent (100 versus 22 miles), and 50% larger in area and much more fertile. Hence Japan’s population today is more than double Britain’s, and its production of land-grown food and timber and in-shore seafood is higher. Until modern industry required importation of oil and metals, Japan was largely self-sufficient in essential resources and had little need for foreign trade – unlike Britain. That’s the geographic background to the isolation that characterized most of Japanese history and that merely increased after 1639.
<Jared Diamond, Upheaval>
너무도 멀리 떨어진 ‘닮은 꼴’의 열도국가 일본과 영국 사이에서도, 그 지리학적 디테일의 차이로 인해, 두 국가의 운명과 문화는 그리고 역사는 몹시도 다른 꼴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와 일본의 상황에도 빗대어 볼 수 있다. 아무리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고,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차이는, 현대의 기술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없이 명백한 차이점으로 남아 두 나라의 ‘다름’을 더욱 명백히 증명해낼 뿐이다. 일본의 특수성에 있어 가장 주목할 점은, 일본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급자족이 대체적으로 가능한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분단 이후 '섬'이 되어 버린 남한의 척박해진 지역문화와 피폐해진 생태계를, 일본열도의 지리적 다채로움과 이에서 기인한 풍요로운 향토문화, 그리고 갖은 자연재해로 인해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숙련이 되어버린 일본의 일상생활에 비교하는 일에는 무리가 따른다. 언어의 차이만큼이나 두 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다른 나라로써, 말하는 법보다 더 빨리 무릎 꿇는 법을 습득해온 일본인들의 ‘문화’를, 어느 날 갑자기 얌전히 무릎을 꿇는 시늉을 해 보이는 정도로 한국에 도입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그리고, 이토록 다른 두 생태계와 문화토양에 뿌리 내린 두 민족의 심성과 습성에 대해 ‘우열’을 논하는 일에도 큰 가치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일본의 좋은 점이 있다면 배우면 그만이지, 일본이 ‘답’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욕의 존재다. 말보다 빨리 ‘칼’이 승부를 보고야 말았을 일본의 특성상, 일본에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데 쓰이는 욕이 들어설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데, ‘욕’의 있고 없음은, 두 나라간의 온전한 의사소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시로써, 윤석렬 대통령의 지난 방미기간 중 발생한 ‘바이든/날리믄’ 스캔들을 보도한 일본 아사히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269444.html
韓国尹大統領 米議会に「この野郎ども」発言で波紋
韓国の大統領の暴言が物議を醸しています。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21日、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た会合の後、アメリカのバイデン大統領と数十秒、歓談しましたが、立ち去る際に韓国の外相らに言葉を掛ける様子がカメラに収められていました。韓国メディアは尹大統領が「国会で『この野郎ども』が承認しなければバイデンは赤っ恥だろうな」と発言したと伝え、さらに「この野郎ども」はアメリカの議会を指すと報じました。韓国大統領府は釈明に追われています。尹大統領は、7月には与党代表に対するSNS上での暴言がカメラに捉えられて流出しています。
‘이 새끼들’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이 없어서 ‘この野郎ども(이 녀석들)’이라는 표현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난처함이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죽여도 죽여도 죽지 않으며 “입만 벌리면 지랄”(223)을 부려대는 문사-좀비들의 천국이었던 한반도와, 꽃잎 하나 떨어지는 순간보다 더 빨리, 오직 그 실력에 따라 생사가 결딴이 나고야 말았던 사무라이들의 천국이었던 일본열도는, 서로에게 있어 아무래도 “지혜롭고 겸허한 모델”(147)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며, 그러므로, ‘일본이 아니라면?’이라는 질문을 검질지게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k선생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적은, 작은, 낮은>에서 못다한 말이 사뭇 많으실 것이다. 이제, 선생의 공부의 “그 임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83). 실제적 임상성의 기반이, 장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라, 그러면 너희는 볼 것이다(요1:39)”라고 하였던 예수의 묵직한 음성처럼, k선생도 그의 후학들과 함께 미시세계 속의 천하제일의 공부인들을 꿈꾸는 공부의 장소를 일구고 있다(“공부를 하려면, 절후(節後)의 미등록-비인가 학교인 ‘藏孰’으로 올 것이다"(37)).
장소에서 후학들을 길러내고 계신 k선생이, 조금 더 단단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 남한사회를 향해 거시적/미시적 일갈을 해 주시길 바래본다. 졸부와 속물, 사이비와 건달로 가득 찬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갸륵한 마음을 지닌 후학들을 가만가만 돌보는 일 말고도, 졸부와 속물, 사이비와 건달 그리고 그 유사품종인 ‘수컷들’(139)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해주시고, 때로는 그네들을 대상으로 맹렬히 싸워도 주시길 바래본다. 더 나아가, k선생의 이론과 실천이, 한자를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니, 한글 문해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에게도 의미 있게 전달되는 모종의 통로를 구축해 나가시길 바래본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제 대중매체를 너무 타박만 하지 마시고, 여러 방편과 통로를 통해 선생의 말과 글을 두루두루 나누어 주시는 보살행으로 그 품을 더 넓혀 주시길 바래본다.
스물 몇 살 때 처음 k선생을 뵌 이후 줄곧 전라도 땅에서 낭인(浪人)으로 살던 중, 서울에서 ‘직장인’이 되어보라는 한 제안을 받았더랬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내 주저함에 k선생은 ‘공부의 실지를 얻어야 한다'시며 서울행을 강력히 권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서울로 터를 옮겨 2023년이면 7년째 ‘회사원’의 삶을 지속 중이다. 사람은 쉬이 변하고, 공부의 길은 급히 어두워져기 마련이니, k선생의 말과 글도 내 삶에서 사라진 어느 새 수년이 되어버렸고, 그 어둑한 시공간에서 나는 일리치를 한 시절 열심히 공부했다. k선생의 자장에서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던 여러 논의와 실천들이 일리치라는 공부 속에서는 확실히 손에 잡힐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일리치를 공부하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읽었던 녹색평론도 다시 만났고, 김종철 선생의 귀한 말씀도 깊이 새겨들을 수 있었다. 김종철 선생께서 2020년 갑가지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분 생전에 서로에게 '살짝' 날을 세웠다던 백낙청 선생의 회고를 통해 다시 김종철 선생을 만나기도 하고, 백낙청 선생이 '선생'으로 치켜세우는 도올 선생의 저작들을 찬찬히 읽어가기도 한다.이렇게 공부는 부질없는 환(幻/環)을 그리며 궤도없는 궤도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고, 이 모든 공부(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k선생의 말과 글이 있었다. 한 때 선생의 제자임을 사칭하고 다녔으나, 그간의 신작들을 꼼꼼히 살피지도 못한 죄를, 이 독후감으로 조금이나마 씻고자 한다.
서울에서 버텨낸 지난 6월 세월 동안, 주유팔로하며 세상 이곳 저곳을 방황하며 밥벌이나 근근히하는 행태를 꾸준히 반복해 오고 있으나, 그 삶이 ‘공부-아님’이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시퍼렇게 응시하며 살 수 있었다. 공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이 공부가 아닌지는 명확히 깨단하게 된 시간 속에서, 나의 지남철이 되어 주신 것은, 외피가 없이 도발적으로 드러난 뇌 혹은 심장과 같이 벌겋게 스스로를 드러내던 날 것 그대로의 내 삶을, 그 짧은 시절 인연 동안 젖어미의 말과 글로 성심껏 먹이고 길러 준 (그리고, 그 벌건 것을 살며시 덮어 준) 선생의 음성과 문자들의 은현한 빛이었다. 선생의 공부터에서, 많은 이들이 새로 태어나고, 그보다 더 많이 죽고, 공부의 매 순간 처절하게 약해지고, 그와 동시에 믿을 수 없이 강해지고, 숱하게 패배해보고, 그리하여 결국,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천하제일의 공부인으로 단련되길 멀리서나마 늘 기원하는 마음이다.
조주란 대체 뭐냐고 물었으나,
금강안은 티없이 맑기만 하다.
동서남북 어디에나 문은 있다네.
쳐도 두들겨도 열리지 않을 뿐.
碧巖錄 제9칙
<적은 생활, 작은 철학, 낮은 공부>를 읽어가는 내내 일리치가 떠오른 것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공부길의 순서 탓이 클지도 모르겠다. 한 시절 k선생을 공부하고, 그 이론과 실천에 대한 대안으로 일리치를 공부했으니 말이다. 나의 이번 독후감은 일리치와 k선생을 견주어보거나 겹쳐보는 일은 아니며, 오히려, 일리치와 k선생이 겹쳐지지 않는 그 여집합에 대한 나름의 인상을 기록해 보는 일에 가깝다. 아래에서 인용한 일리치의 사유와 k선생의 사유가 공명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니, k선생을 공부하였거나 공부하는 이들에게라면 이 인용구들과 <적은, 작은, 낮은>의 여러 구절을 병독해보는 노력만으로도 큰 유익과 보람이 있을 것이다. k선생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리치의 흔적을 남겨본다. (이하는 일리치에 대한 인용구임.)
근원적 독점
근대화된 가난은 일리치 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근원적 독점(radical monopoly)’과 연관된다. 어떤 물건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근원적 독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지만 가격이 비싸서 소수의 부유층만 구매할 수 있는 단계다. 2단계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통사람들 대다수가 구매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상품은 갖고 있으면 ‘편리한’ 물건이다. 3단계는 그 상품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재조직되는 단계로, 이제 물건은 ‘편의품’에서 ‘필수품’이 된다. 173
일리치는 ‘근원적 독점’과 함께 ‘반생산성’ 개념으로 현대기술의 근원적 문제를 지적했다. 반생산성은 기술이 어떤 한계점을 지나면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일리치의 독창적 개념이다. “의료시설은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라는 첫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졌던 <의학의 한계>에서 그는 약이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고치는 단계가 있지만 어떤 한계를 지나면 생명을 살리기보다 건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의 진단은 현실이 되었다. 병원은 치료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병을 만들어낸다. 학교는 학생들에게서 스스로 배울 능력을 빼앗고, 감옥은 죄를 양산하고, 자동차는 교통을 지체시킨다. 반생산성 단계에 이르면 제도로 인해 개인들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빼앗기고, 그 대신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도록 내몰린다. 174
녹색평론 131호, 더글러스 러미스의 <<이반 일리치를 회상하며>>에서 발췌
욕구’와 토착가치
일리치가 말하는 공유재란 자기 집 대문 밖에, 즉 자기 소유 밖에 위치해 있으나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권한이 인정된 부분을 뜻한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사용권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부분이다. .... 말하자면 공유재란 가족과 공동체의 자급적 삶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이었다. 또한 공유재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에서 ‘희소한 가치(scarcity)’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 그[일리치]의 비범함은 공유재의 파괴가 지니는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변화, 즉 공유재의 파괴로 인해 인간이 주변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원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천착해냈다는 데 있다. 일리치에 따르면 공유지, 내지는 공유재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주변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에 철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전에 환경은 사람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유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공유재에 울타리가 쳐진 이후 환경은 일차적으로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변하게 되었다. 즉 자급적 삶을 위한 공유재가 상품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희소한 가치’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급적/자치적 존재가 아니라 늘 무언가를 욕구하는 존재,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늘 ‘기본적 욕구(basic necessity)’가 충족되어야 하는 소비자이자 산업노동력, 즉 호모에코노미쿠스가 탄생한 것이다. 157
일리치는 이러한 ‘희소성의 세계’가 전면에 나선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우연과 축복과 은총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한다. 159
따라서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 일리치는 희소성의 가치 대신 토착가치를 말한다. 토착, 즉 ‘vernacular’라는 말은 ‘뿌리를 내린 상태’나 ‘머물러 살기’라는 뜻을 함축하는 인도게르만어 어원에서 온 말이다. 그리스로마 고전 시대에 이 말은 ‘집에서 담근’, ‘집에서 만든’이라는 뜻을 지녔다. 일리치는 공유재에서 이끌어낸 모든 가치로서 시장에서 사고팔지는 않지만 개인이 자기 것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을 일리치는 상품 및 산업경제에 대비되는 말로 쓰기를 제안했다. 159
‘가난’의 은총
1970년대에 일리치는 교육과 의료, 주거, 교통 등 현대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토착가치가 희소성의 가치로 바뀌게 되었는지 파헤쳤다. .... 말하자면 현대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리치의 분석을 관통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곤궁한 인간’, 즉 호모에코노미쿠스의 탄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의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인간을 ‘욕구’를 가진 존재,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존재로 보고, 환경을 희소한 자원으로 이해하며, 삶의 전 분야에서 토착가치를 지워나감으로써 자립과 자급을 위한 삶의 가능성을 말살하고 근대적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전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리치는 칼 폴라니(<<거대한 전환>>)를 읽고 이러한 근대의 확실성들에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160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인간 삶의 객관적 조건, 즉 ‘삶의 필연’으로부터 자기한계와 연민이라는 인간적 감정을 습득하고 삶의 필연에 순응 내지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다. ‘삶의 필연’이란 전통사회의 사람들이 자각했던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인간의 조건’을 가리킨다. 종교와 문화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삶의 필연에 순응하고 동시에 저항하면서 자기한계를 깨달아갔던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은 ‘가난’이었다. ‘가난’은 오늘날처럼 부나 지위, 명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 ‘삶의 필연’에 생태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해나갈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삶의 스타일이었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는 ‘가난’이 결코 박멸의 대상이거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난’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살아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의미했다.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는 축적된 ‘부’가 아니라 실은 바로 이 ‘가난’이 꽃피워낸 결실인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가난’은 일리치에 의하면 ‘지혜로운 인간’을 탄생시킨 반면 오늘날에는 ‘가난’을 끊임없이 박멸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곤궁한 인간’, 즉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강박, 결핍감에 빠진 인간을 탄생시켰다. 161
결국 일리치의 관점에서 보면 은총과 자유, 축복, 본래적인 의미에서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우리시대의 확실성인 경제학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경제구조 때문에 문화영역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수렴된다. 탈학교, 탈의료화 등에 대한 그의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한계 지우기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은총, 또는 축복이라 부르는 것이 경제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을 때만 개발의 붕괴 뒤 이어질 민중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2
녹색평론 131호, 박경미의 <<근대의 ‘확실성’을 넘어서>>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