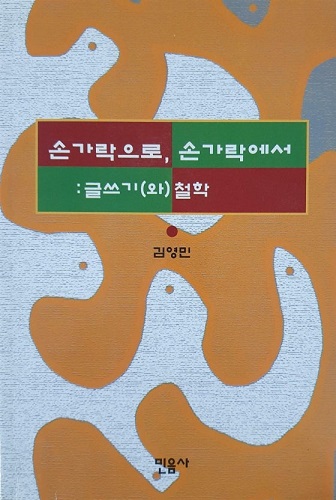
/
서문 : 손가락의 사연과 내력
<글쓰기> 담론이 한동안 우리 학계의 일각을 흔들었다. 당대의 학문적 현안에 무관심한 이가 아니라면 그 여진(餘振)에 더러 일말의 각성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나도 내내 그 담론의 중심에서 비켜나지 않고 내 공부의 기억할 만한 풍경으로 삼고자 나름의 열정과 재주를 모았다. (내 공부는 다만 풍경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던가. 그리고 풍경이란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어야 하는 법이다.) 무릇 모든 풍경은 지나쳐가는 것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기억의 실체를 이룰 것이다.
<손가락>은 내가 세상과 만나는 자리의 한 부분이다.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늘 말없이 세상과 겹쳐온 부분이다. 그것은 문자적 교양의 과잉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 열어준 출구지평(出口地平)이기도 하다. 나는 그 속에서, 계절 없이 외투깃을 따로 세우고 무수한 수입 관념의 계보를 단숨에 주워섬기면서도 내 삶을 왜소하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경지(無境地)와 비성숙을 조금씩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것은 기실 온고지신수신진덕(溫故知新修身進德)이라는 낡고 묵은 지혜를 되살리는 이치에 닿아 있었다.
나는 하나의 머리에서 내려와 열 개의 손가락으로 퍼져나갔다. 그것들은 부지런하면서도 충실하고, 어느 시인의 말처럼 <손끝마다 반짝이는 10개의 눈>이지만, 말수가 적고 겸손하다. <정오의 해변>에서 <손가락>으로 내 화두가 바뀌는 동안 나도 제법 겸손해졌다. 그 겸손이 존재론을 이룰 때까지 내 손가락들은 변함없이 분주할 것이다.
글쓰기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지친 끝에 내려앉은 곳, 그곳이 손가락이다. 앎과 삶을 한 품에 보듬고 그 긴장을 내 삶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면, 손가락에 스며드는 나와 세상의 만남과 그 조용한 대화에 유의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머리를 맴도는 관념의 계몽을 넘어서려는 자라면 <손가락으로> 내려갈 법하고, <손가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조그만 희망을 가질 법하다.
당연히 이 희망은 우리 철학과 인문학의 자생력을 엿보는 창구로 이어진다. (학문의 주체성은 임의로 짜낼 수는 없는 법이니, 자생력에 깊이와 역사가 생기면 자연스레 배어나올 것이다.) 이 책은 그 창구의 가까운 거리에서 손가락들이 조용하고 바쁘게 움직인 사연과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
<문학과 인문학의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문예비평》에 연재한 글들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동인들에게 감사하며, 지역 비평계의 활성화를 위한 그들의 감투(敢鬪)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인문학연구회>의 여러 지기들이 제공한 좋은 자극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글쓰기> 작업에 그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여러 학인들에게 이 글이 작은 정표가 되었으면 한다. 그 밖에 많은 모임과 글을 통해서 이 주제를 두고 대화했던 이들을 마음에 새겨둔다.
(오늘 밤에는 깨끗이 손가락들을 씻고 자리에 누워, 첫새벽에 잠이 깨거든 그 손가락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며시 만져보아라.)
4331년 5월
 (9) 소설 속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7
(9) 소설 속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7
 (11) 진리․일리․무리-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 현실사, 1998
(11) 진리․일리․무리-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 현실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