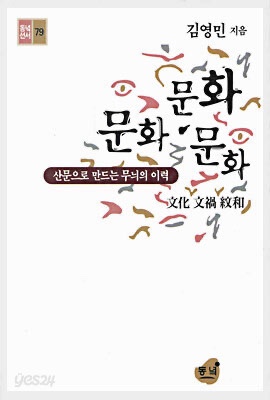
/
문화文化 문화文禍 문화紋和
산문으로 만드는 무늬의 이력
이 책은 기성의 문화(文化)가 문화(文禍)로 변질되어 추락하는 여러 현상에 주목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틈을 내어 문화(紋和)의 지평을 열어 보려는 바람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틈새 만들기는 가령, 전근대를 딛고 근대와 탈근대의 접선을 타면서 이른바 ‘심층 근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든지, 좌와 우를 넘어서는 탈이데올로기적 공간을 모색한다든지, 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출세간적 공동체주의 사이의 괴리를 메운다든지 하는 류의 노력에서 이미 유형화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이 시대 지식인의 길을 특히 ‘접선의 존재론’ 이라고 이름붙인 것도 유사한 문제 의식의 연장이었다.
책의 주지(主旨)를 내세우긴 했지만, 이 작은 산문집은 애초 마음을 다잡고 한 생각을 일관되게 굴려 쓰여진 것은 아니다. 지난 삼 사 년 동안 나는 학술 논문 이외에도 온갖 종류의 원고 청탁에 시달렸는데, 고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력을 모아 집필하곤 했던 것이 쌓여 이처럼 책으로 묶여지게 되었다. 산문집을 둘러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실 문체나 스타일의 훈련도 없이 생활 표피를 스치는 감상과 상식의 메시 지를 끄적여 놓은 산문집이 적지 않고. '붓가는 대로 쓴다'는 소문에 기대어 구성력 없는 인상기를 내놓고 마는 경우가 태반인 데다, 심지어 일부 지각 없는 명사(名士)들이 문화적 허영심의 배설물을 산문집의 형태로 고집하는 병통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뜻 중심주의’에 순치된 탓에 근대적 인식의 그물에 담기지 않는 글이라면 그저 학문성을 갖추지 못한 잡문으로 치부하는 이분법적 태도마저 아직 강고하다. 그리고 내가 한때 논문 중심주의의 아성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잡된 글쓰기’가 그 방법론적 내실보다는 어감(語感)을 트집 잡는 수준의 비판에 자주 노출되고 보니 운신이 쉽지 않다. 심지어 ‘인식의 노동’―비록 그것이 어느 특권적 순간에 이루어진 제아무리 심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오직 글쓰기' 를 통해서 스스로의 경과와 내실을 정당화한다는 평심한 지적조차 제대로 먹히지 않는 지경이다. 이들은 글을 지나치게 혹사하거나 혹은 너무 안이하게 접대한다.
산문은 운문처럼 자주 빛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우리 삶이 드러내는 여러 무늬에 진솔하고 섬세하게 접근하려는 다차원적 복합 서사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논문처럼 견고하거나 자기 방어적이지도 않고, 그러므로 배타적이지도 않다. 산문은 종종 실없이 실증 공간을 이탈해서 기억의 내력과 꿈의 지평을 배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운문을 풀어놓은 것도 아니며 그저 논문이 한숨을 돌리는 쉼터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산문은 교과서적 학식과는 다른 심미적 교양, 혹은 계몽 그 자체를 넘어서는 이른바 '계몽의 계몽' 기능을 담당하면서, 한편 정보 집약적 텍스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뜻을 일깨우는 이른바 심학적(心學的) 전통의 현대적 변용을 겪어 나왔다. 이 점은 문자 체계의 안정된 객관성이 과학성에만 봉사해 왔던 일방적 전통을 발본적으로 반성케 해준다. 아울러 근대 학문이 전문화, 분업화되면서 여러 형태의 논증적 글쓰기가 계발되었고, 이 와중에 산문은 논문과 운문 사이의 틈새 지평을 노리면서 스스로의 몸피를 슬기롭게 불리고 그 형태와 범위에서 유래 없는 풍요를 구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시대의 불확실성을 글쓰기의 철학과 접맥시키려는 여러 학자들의 노력 끝에 이른바 ‘산문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만한 생각의 덩어리가 정착되었다. 산문은 이제 더 이상 ‘글의 변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와 교감하는 그 나름의 이력을 쌓아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논문의 형식성에 의해서 학문성을 전유하던 근대 실증주의의 버릇도 어느 정도 퇴조한 터에, 산문은 '어쩌면' 언젠가는 모든 형태의 글쓰기를 소통시키는 글쓰기의 글쓰기'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조금은, 들뜨게 된다.
이를테면 산문의 형이상학은 합리적이며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가 아니라 복잡하고 우연적이며 심지어 애매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삶의 현실에 그 터를 둔다. 산문에 비교적 특정한 형식을 가리지 않는 것은, 논문과 운문이라는 두 '과장'의 틈새를 뚫고, 일률적인 모습에 고착되지 않는 우리 삶의 마당 속에 스스럼없이, 성큼, 들어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기 있고, 그리고 섬세하게 말이다. (결기 없는 섬세는 딜레탕티슴에 빠지고, 투박한 결기는 자가 당착이다.)
산문의 형이상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복잡 다기하고 변화 무쌍한 현실일 뿐이니, 이것을 두고 굳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울 터.
아무튼 산문을 백안시하던 지식 엘리트의 시선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균열의 틈으로 우리 삶에 새롭게 접근하는 노력이 나름의 무늬와 이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산문에 힘을 실어 주는 배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책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 책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연히’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우연의 틈새에서 어느 가난한 필연의 흔적이라도 비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아무래도 ‘무늬의 어울림’ (紋和)을 위해서는 우연 같은 필연, 혹은 필연 같은 우연들이 수없이 온축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주의 남고산 자락에서
 (13) 지식인과 심층근대화 -접선의 존재론-, 철학과 현실사, 1999
(13) 지식인과 심층근대화 -접선의 존재론-, 철학과 현실사, 1999
 (11) 진리․일리․무리-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 현실사, 1998
(11) 진리․일리․무리-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 현실사, 1998